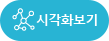| 항목 ID | GC01202953 |
|---|---|
| 한자 | 江- |
| 영어의미역 | Song of Pulling River Boat |
| 이칭/별칭 | 배 띄우는 노래,고삐줄 당기는 소리 |
| 분야 | 구비 전승·언어·문학/구비 전승,문화유산/무형 유산 |
| 유형 | 작품/민요와 무가 |
| 지역 | 경상북도 구미시 |
| 집필자 | 최광석 |
[정의]
경상북도 구미시에서 육지에 올려놓은 배를 띄우기 위해 끌어내리며 부르는 노동요.
[개설]
노를 젓거나 그물을 당기는 일처럼 강으로 배를 끌어내리는 일도 여러 사람의 협력이 필요하다. 「배 띄우는 노래」라고도 하는 「강배 끄는 소리」는 어업을 생업으로 삼아 살아가는 곳에서 드물게 전승된다. 보통은 ‘어하’라는 여음이 들어간다.
[채록/수집상황]
낙동강을 중심으로 살았던 구미 지역에서 어업을 생업으로 하던 주민들이 불렀던 것이 몇 편 채록되었다. 노래의 특성상 사설은 일정하지 않다.
[구성 및 형식]
「강배 끄는 소리」는 일정하게 되풀이되는 여음(뒷소리)과 실질적 의미가 있는 앞소리를 번갈아가며 부르는 선후창 형식이다. 구미 채록본에는 주로 ‘으여차’와 ‘우여’라는 여음을 되풀이하며 사설이 이어진다.
[내용]
「강배 끄는 소리」는 뒷소리꾼에 의해 여음이 규칙적으로 삽입되면서 “숨이 차서 못 가겠다. 방구틈이다 조심해라. 낙동강이다 까뜩그리믄 샛강이다 용궁 간다. 까시밭이다 조심해라. 비륵 끝이다 앞이 맥혔다.”로 사설이 이어진다. 배를 끌 때마다 부딪치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책록본에서는 사설이 이와 달라질 수 있다.
[의의와 평가]
「강배 끄는 소리」는 낙동강을 젓줄 삼아 살아온 구미 지역 민중들의 애환이 담겨 있는 민요라 할 수 있다. 배를 끄는 일은 매우 고된 노동이며 무엇보다 힘을 일시에 발휘하기 위해 행동의 통일이 필요하다. 그래서 「강배 끄는 소리」와 같은 노래를 부르면서 일의 효율을 높인다. 배를 끌면서 닥치는 상황을 여러 사람이 함께 인지해야 사고를 막을 수 있다. 사설이 일정할 수 없는 것은 배를 끌면서 부딪치는 실제 상황이 사설에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이다.